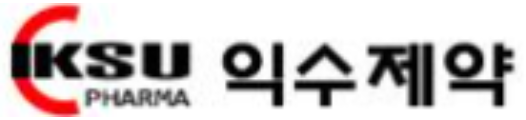검색

채용
정보
정보
"층약국 입점 임대수입 폭락"…독점권 손배청구 했지만
기사입력 : 17.11.29 12:14:59
2
가
 플친추가
플친추가
 플친추가
플친추가
수원지법 "1층 약국 분양계약서상 업종제한 규정 모든 상가에 미치지 못해"
- PR
- 2026 제약·바이오 시장 전망 신청
- 2025.11.14(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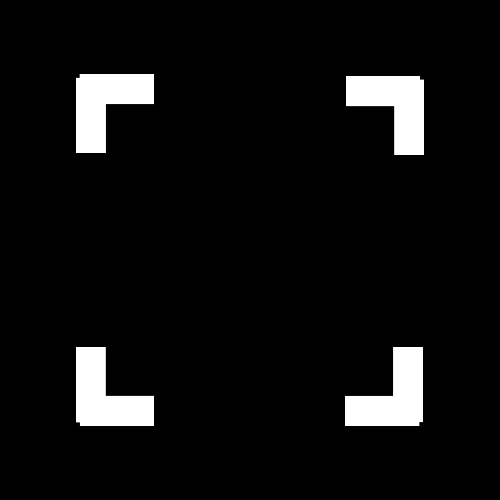

1층 약국 분양계약서상 업종제한 규정의 범위가 모든 상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사건을 보면 K약사는 2001년 9월 용인지역 한 상가 1층 점포를 분양받아 사망한 2016년 1월까지 약국을 운영했다.
이후 K약사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운영하던 약국을 또 다른 약사와 2016년 3월 경 월세 1800만원, 권리금 10억원에 3년짜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층에 약국이 개설되면서 1층 약국 수입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결국 자녀들은 1층 약국의 월세를 1500만원으로 조정했고 다시 몇개월 후 450만원으로 낮춰줘야 했다.
결국 자녀 3명은 2층약국 건물주와 약사를 상대로 각 1000만원 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모든 점포는 구체적으로 약국 및 병원 등으로 업종이 지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생활편의시설 용도'로 업종이 지정돼 분양된 것"이라며 "망인인 K약사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제119호 점포에 관해 독점적인 약국 영업점포로 분양 받았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건물 관리규약에 의하면 119호 점포 이외에는 약국으로 분양하지 못한다"며 "2층 약국자리 점포 수분양자인 K씨와 점포를 임차한 약사는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건물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원고들은 "피고들은 위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해 원고들의 1층 점포 약국 영업 및 임대 영업에 상당한 손해를 가했다"며 "피고들은 원고들이 임대료 조정으로 입은 손해 4759만원 중 각 1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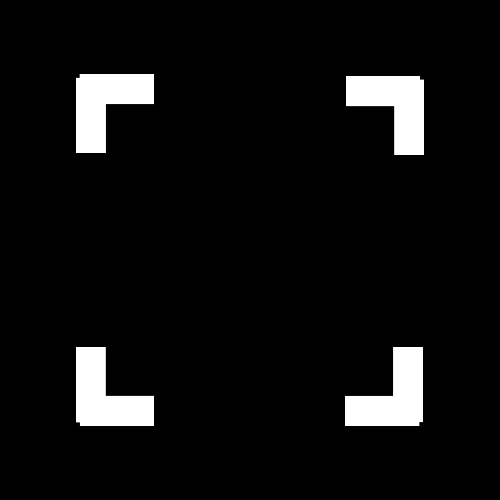

▲원고들이 근거로 제시한 분양약정서
그러나 법원은 약국 임대를 하는 자녀 3명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수원중앙지법은 판결문을 통해 "건축사가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해 분양하거나 일부 점포에 대해서만 업종을 지정해 분양, 점포 입주자들 상호간 업종 제한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면 각 점포 수분양자들에게 지정된 업종을 독점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음과 동시에 다른 점포 수분양자들에게 지정된 업종은 운영할 수 없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그에 관한 내용을 분양계약서 등에 기재해 명확히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1층 점포를 제외한 제 213호 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다른 나머지 점포들에는 업종지정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해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각 점포의 분양계약서상 생활편의시설이라고 규정한 것이 용도를 지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독점적 영업권을 위해 업종을 지정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체육시설이 아닌 기타 시설에 관해 포괄적으로 용도를 지정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건물 내 각 병원들도 업종이 지정된 것이 아니라 체육시설이 아닌 기타 편의시설 중 하나로 분양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설령 1층 점포에 대해서만 약국 업종을 독점적으로 보장한 것이라고 해도 업종제한 등 의 의무는 상가 수분양자들 사이에서 이를 수인하기로 하는 동의를 기초로 발생한다"며 "전체 수분양자들과의 분양계약 과정에서 일부 점포에 대한 업종지정 사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시키거나 일부 점포에 대해서 업종 지정이 있었다는 사정이 수분양자들 모두에게 충분히 공시돼 있어야 하는데 213호 점포 분양계약은 1층 점포 분양계약보다 먼저 체결됐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망인인 K약사는 이 사건 건물 1층 점포 이외에 다른 점포(제118호, 제208호, 제213호)들을 임차해 약국 영업을 해온 점 등에 비춰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다른 수분양자들이 1층 사건 점포 외 약국영업 제한에 관해 묵시적으로 수인하기로 동의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즉 업종지정의 효력이 상가분양자와 그로부터 독점적인 운영을 보장받은 수분양자 이외에 다른 수분양자 등에게 미치기 위해서는, 상가분양자와 모든 수분양자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서에 업종지정 또는 권장업종에 관한 지정이 있거나 업종제한 약정이 체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건축주와 수분양자의 업종지정 약정은 다른 수분양자의 업종을 제한하는 효력이 없다고 본 게 법원의 판단의 핵심이다.
강신국 기자(ksk@dailypharm.com)
글자크기 설정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
건물전체 계약서에 다 써있어야17.11.29 15:59:040 수정 삭제 0 0
-
층약국이라~~ 의약분업의 사생아같은 존재이지만~ 엄연한 경쟁사회에서 머라할수도 없고~ 하지만.. 참 보기는 좋지 않다~17.11.29 12:23:002 수정 삭제 4 3
0/300
이용약관 | 개인정보 취급방침 | 법적고지
Copyright ⓒ Dailypharm 1999-2025,All rights reserved.
메일보내기
기사제목 : 층약국 입점 임대수입 폭락…독점권 손배청구 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