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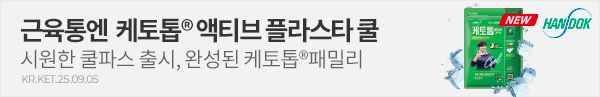
채용
정보
정보
제네릭 약가인하, 제약 CSO 영업패턴 변화 예고
기사입력 : 19.03.28 12:10:44
2
가
 플친추가
플친추가
 플친추가
플친추가
약가차등제로 마진율 하락 우려…문닫는 업체 속출할 것
CSO들이 말하는 "다 죽는다"와 "차라리 잘됐다"
영업 스폐셜티 제공하는 본 개념 회귀…자정작용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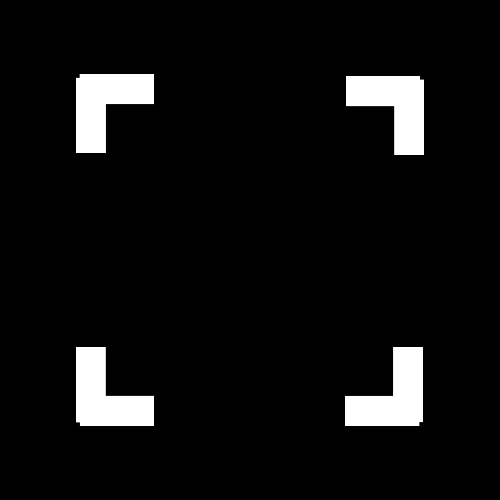

보건복지부는 27일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하반기부터 자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실시와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DMF) 충족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제네릭 약가(충족시 기존과 동일)는 최대 38.7%까지 인하된다. 기등재 약품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이번 약가제도의 골자는 현재 동일제제-동일가격 원칙에서 제네릭 개발 노력, 즉 제약기업 책임성 강화와 시간, 비용 투자 등에 따라 가격을 달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약가제도 개편은 단순히 '제약업계' 만의 관심사가 아니다. 산업을 둘러싼 수많은 이해관계가 존재한다. 그중 가장 유심히 지켜본 회사들이 영업대행업체(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이다.
◆"죽겠다"는 CSO들=표정이 어두운 쪽은 대부분 작은 규모, 이른바 '개인사업자 CSO'들이다.
이들에게 제네릭 개편안은 그야말로 '직격탄'이다. 단순한 논리다. 제네릭 가격이 하락하면 이들의 마진율이 떨어진다. "생동과 DMF 요건을 충족한 상한가 제네릭을 도입하면 되지 않나" 싶지만 이들 CSO의 주 고객이 또 대부분 "죽겠다"는 중소제약사들이다.
중소제약사들은 2014년 리베이트 투아웃제 이후, 영업조직을 대폭 축소했다. 아예 영업부를 없애고 CSO를 활용해 의약품을 공급하기 시작한 곳들도 적잖다.
우리나라에서 'CSO'는 지금 이같은 형태가 주류다. 2014년 이후 이같은 CSO는 부흥했다. CSO 의존도가 튼 중소제약사들로 인해 CSO가 판매수수료 인상을 요구하는 등 주도권을 쥐는 경우도 있다.
X

공동생동으로 제네릭 난립이 가능했던 상황이 바뀌면서 중소제약사들이 힘들어지고 작은 CSO들도 위기에 봉착한 셈이다.
AD

영업사원 방문신청
이벤트참여 →
한 CSO 대표는 "기등재 품목에 주어진 유예기간인 3년동안 많은 변화가 있을 듯 하다. 당장에 특허가 만료되는 대형 오리지널 품목의 제네릭 유치 경쟁에서부터 밀릴 수 밖에 없다. 결국 구조조정을 통한 규모 축소로 이어질 것이고 문을 닫는 업체들도 생길 것이다"라고 토로했다.
◆"필요하다"는 CSO들=사실 CSO는 품목을 들여오는 개념이 아니다.
총판도매, 코프로모션, 코마케팅 계약과 구분되야 하는 이유다. 단순히 '고객'(제약사)의 '서비스 업체'라는 관계를 넘어 '전략적 파트너'의 위치를 갖는 것이 CSO의 바른 개념이다.
다시 말해 CSO는 의약품이라는 재화를 넘겨받아 판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영업사원을 통한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근간으로 한다.
이같은 정통 CSO는 우리나라에서 흥행하지 못했다. 2012년 CSO란 개념을 화두에 올린 인벤티브헬스는 2015년 사업을 철수했다. 앞선 2000년 설립된 유디스인터내셔날이 있었고 같은 해 후발주자로 전세계 넘버원 CSO기업인 이노벡스 퀸타일즈가 국내에 상륙하기도 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하지만 불씨는 남아있다. 국내에서도 정식 법인을 출범하고 '영업 스폐셜티'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몇몇 CSO가 자리를 잡았다. 이들은 오리지널 품목, 개량신약, 복합제 등 자체 경쟁력을 갖춘 제품들 다수를 취급하고 있다. '제네릭 영업'만이 선택지가 아니며 상한가 제네릭 유치가 어려운 일도 아니다.
또 다른 CSO의 대표는 "산업을 위해서 바른 개념의 CSO가 자리잡아야 한다. 약가 개편안은 그런 차원에서 순기능이 있다고 본다. '리베이트 영업을 해 줄 회사'를 찾는 제약사, 또 그 역할을 자청하는 아류 CSO'의 시대가 끝날때가 됐다"고 말했다.
어윤호 기자(unkindfish@dailypharm.com)
글자크기 설정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관련기사


-
예수님 왈 누가 저여인에게 돌을 던질수 있겠노라고 cso도 엄연한 유통의 한단계입니다 자체 영업망을 갖춘 제약사들에 비해 개인사업자들은 비용처리 항목도 전무하고 가혹한 세금부담 감당하면서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차떼고 포떼고 나면 회사 다닐때보다 못한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리베이트라는 고정관념으로만 보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라는 버팀목 없이 모든걸 감수하고 뛰는 개인사업자들에게 조언과 관심 부탁드립니다19.03.29 02:21:011 수정 삭제 8 4
-
그냥 단지 리베이트 영업을 대행하는 개인사업자일 뿐입니다. 참 부끄러운 직업입니다. 뒷돈을 주고 영업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직업이니 어디에 대놓고 자랑도 못합니다. 자랑은 못해도 무슨일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할 수는 있어야 함에도 참 켕기는데가 많다보니 하지를 못합니다. 참 직업이라 말하기도 남부끄러운 직업입니다. 이제 그만하려 합니다. 그간 참 고민 많았더랬습니다.19.03.28 15:49:191 수정 삭제 12 13
0/300
이용약관 | 개인정보 취급방침 | 법적고지
Copyright ⓒ Dailypharm 1999-2025,All rights reserved.
메일보내기
기사제목 : 제네릭 약가인하, 제약 CSO 영업패턴 변화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