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채용
정보
정보
[데스크시선] 고삐 풀린 기술특례 상장제도
기사입력 : 19.04.19 06:20:20
0
가
 플친추가
플친추가
 플친추가
플친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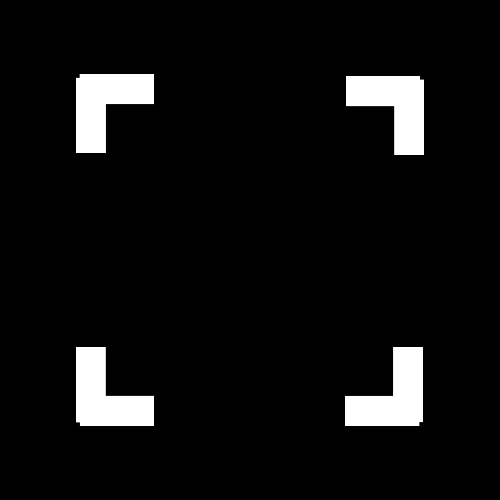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을까. 근본 원인은 코스닥 상장 요건 완화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바로 기술특례 상장제도를 말함인데, 이 제도는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외부 검증기관을 통해 심사한 뒤 수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상장 기회를 주는 제도로 2005년 도입됐다. 기술특례로 상장하려면 거래소가 지정한 기술보증기금/나이스평가정보/한국기업데이터 등 전문평가기관 두 곳에 평가를 신청해 모두 BBB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고, 이 중 적어도 한 곳에서는 A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후 상장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코스닥시장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주로 연구개발에 투자를 많이 하는 바이오·헬스케어 업체 또는 IT기업 등이 대상이다.
일반적인 코스닥 상장 조건은 법인설립 3년 이상 유지/자기자본 30억원 이상 이지만 기술특례 상장은 설립기간 제한없이, 자기자본 10억원만 있으면 된다. 당기순이익 20억원, 자기자본이익률 10%, 매출 100억원 및 시가총액 300억원, 매출 50억원 및 매출증가율 20%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하는 코스닥 시장 신규 상장 기업의 수익성 기준도 적용받지 않는 특혜가 있다. 다시 말해 기술력 또는 개발 물질의 가치 평가만 인정받으면 땅 짚고 헤엄치기로 상장이라는 별을 딸 수 있다. 지금까지 이 제도를 활용해 코스닥에 입성한 바이오/헬스케어기업은 51개 정도로 파악된다.
'상장=돈벼락'이라는 등식과 함께 이른바 돈 냄새를 맡은 일부 벤처캐피탈의 바이오제약 사냥도 횡횡하다. 투자한 기업이 상장할 경우, 투자자는 원금의 수십에서 수백 배에 이르는 이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0년 벤처캐피탈의 바이오제약 투자 규모는 840억원에서 지난해 7016억원으로 7배 가량 증가했다. 바이오벤처 창업도 꾸준히 증가 추세다. 연도별 바이오벤처 창업 수를 살펴보면, 2000년-291개, 2005년-140개, 2010년-479개, 2017년-306개로 현재 약 1830개 업체가 활동 중이다.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지난 10년 새 0.4%에서 1.7%로 소폭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실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X

AD

뉴베인 약국 인사이드
이벤트참여 →
극히 제한적인 사례지만 이처럼 손쉬운 코스닥 상장은 경영진의 모럴 헤저드(도덕적 헤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최소 수천억원에서 최대 수조원에 이르는 주식가치에 따른 부정적 반대급부 행위도 도마에 오른다. A사는 창업이래 실적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이 회사의 최고경영자는 해외 출장 시, 비지니스석 이용은 물론 최고급 외제 승용차와 팬트하우스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B사 임원은 수백억대 거액의 차익 실현 후 회사를 떠나는 일도 있었다. 몇몇 기업은 아예 임상을 조작하거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주식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엔브렐/레미케이트/허셉틴 등 통상적 개념인 바이오의약품이 아닌 케미칼 제네릭을 개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라는 가짜 탈을 쓰고 있는 곳도 있다.
누군가 대한민국 제약바이오산업의 미래를 묻는다면 자신있게 'We Can Do It!'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바이오텍의 메카로 불리는 판교바이오밸리에서 불철주야 R&D에 매진하는 연구자들의 숭고한 노력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리고 많은 바이오제약사들의 국위선양에 머리숙여 감사를 전한다. 다만 건실한 기업의 탄생과 올곧은 투자문화 정립을 위해서는 대수술이 불가피하다. 검증되지 않은 물질과 누구나 손쉽게 개발할 수 있는 일반적 의약품을 미래 신성장 동력이라는 미명 아래 지금처럼 증권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은 바이오 버블을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진정한 신약 후보 물질은 시장이 먼저 알아본다. 이는 빅파마들의 바이오텍 인수합병 사례와 다양한 라이선스 계약 선례가 방증하고 있다. 제약강국의 첩경은 느슨한 기업 상장 특례가 아닌 현실성 있는 지원 제도와 정책에 있음을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대규모 투자기금 조성이 급선무다. 항암신약개발사업단과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등이 그 좋은 예지만 지금의 예산보다 2~3배 이상 증액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는 상장 후 연구개발 투자금 확보라는 지금의 잘못된 인식을 서서히 계도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실적 없는 기 상장 바이오제약에 대한 옥석가리기 즉 과감한 퇴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물질 개발은 명목이고, 오직 돈방석만 바라고 상장을 준비하는 가짜 바이오제약에 대한 기술특례 상장제도는 이제 과감히 철폐할 때다.
노병철 기자(sasiman@dailypharm.com)
글자크기 설정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0/300
이용약관 | 개인정보 취급방침 | 법적고지
Copyright ⓒ Dailypharm 1999-2025,All rights reserved.
메일보내기
기사제목 : [데스크시선] 고삐 풀린 기술특례 상장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