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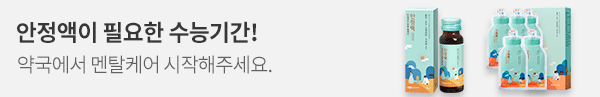
채용
정보
정보
제약사 반품 기준 '천차만별'…"비용·인력 낭비 우려"
기사입력 : 21.03.11 06:20:25
1
가
 플친추가
플친추가
 플친추가
플친추가
72개 제약사 규정 살펴보니…사용기한·차감 비율 제각각
반품 불가도 빈번…"약국서 클레임해야 겨우 받는 경우도"
약사회-제약바이오협-유통협 개선 추진…표준화 가이드라인 절실
- AD
-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데일리팜이 11일 전국 50여곳 의약품유통업체를 대상으로 72개 제약사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 인수 기준을 살펴본 결과, 반품 불가부터 일련번호 관리 여부, 연 매출액별 20~50% 차감 등 제각각이었다.
많은 제약사가 사용기한에 따라 반품을 제한하고 있는데, 기준은 천차만별이다. 예를들어 다국적 A사는 사용기한이 6개월 지난 제품의 반품을 받지 않고 있는 반면, 다국적 B사는 사용기한이 지나야 반품이 가능하다. 다국적 C사는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의 반품은 받지만, 매입액의 0.5%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국내 D사는 사용기한 6개월 미만까지만 전액 반품해주며, 1년이 지난 제품은 30%를 차감하고 있다. 국내 E사는 매입액 0.3% 한도 내에서 사용기간 1년 미만 제품은 15%, 6개월 미만 제품은 30%를 차감한다.


▲국내외 제약사 의약품 반품 규정
1년에 한번만 반품을 받겠다고 명시한 제약사도 여럿 있다. 다국적 F사는 1년에 1회 반품을 받는데, 완포장약은 70%, 소분약은 50%를 차감한다. 다국적 G사도 지정된 사용기한 내 약만 연 1회 반품을 받는다. 다국적 H사는 1년 1회 예산 한도 이내에서만 진행한다.
일부 제약사는 아예 반품을 거부하기도 한다. 지난해 반품 문제로 유통업계와 갈등을 겪었던 다국적 I사 역시 갈등 이후 반품을 일부 받고 있지만, 50%를 차감한다. 몇몇 제약사는 약국에서 클레임을 하는 경우에만 겨우 반품을 받는다.
이처럼 제약사가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의약품유통업체에 반품 재고가 쌓였고, 한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다. 천차만별인 규정을 하나하나 살펴보느라 여기에만 매달리는 인력도 적지 않다.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반품 창고에만 4명씩 달라붙어 하루종일 반품 작업을 진행한다"라며 "이마저도 규정과 달리 반품을 거부하거나 시기를 늦추는 바람에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반품 표준 기준을 만들어 불합리한 규정을 손질하고 불필요한 인력 소모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반품 규모도 문제다. 지난해 기준 50개 유통업체에서 발생한 반품 의약품만 650억원 규모다. 의약품 폐기로 낭비되는 비용과 이로 인한 환경 오염까지 고려하면 사회적 비용 소모가 수조원에 달한다.
제약업계도 이같은 지적에 공감대는 이루고 있다. 대한약사회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3개 단체는 지난달 17일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처리 등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단체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있는 만큼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제정되고 실제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결국 개별 제약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대목이다.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개별 유통사가 반품 재고를 끌어안고 있는데도 한계에 다다랐다. 궁극적으로 반품 의약품을 줄여나가는 것을 목표로 표준화된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정새임 기자(same@dailypharm.com)
글자크기 설정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관련기사


-
니들이 만들어서 팔아놓고 왜 반품을안받아줘?
약가에 반품까지고려한거면서 나쁜놈들21.03.11 10:05:180 수정 삭제 1 3
0/300
이용약관 | 개인정보 취급방침 | 법적고지
Copyright ⓒ Dailypharm 1999-2025,All rights reserved.
메일보내기
기사제목 : 제약사 반품 기준 천차만별…비용·인력 낭비 우려
















